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사주 음양오행 중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상생과 서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상극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1.음양오행의 상생(相生)
목생화-화생토-토생금-금생수-수생목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중 나무를 태우면 불이 나니 목생화이며 불이 타면 재가 되어 흙이 되니 화생토이고 흙이 굳어 땅속에서 광물이 되므로 토생금 상생이라 한다.
땅속 암반층 돌 틈에서는 샘물이 솟아오르니 금생수라고 하고 물을 주면 그것을 흡수하여 나무가 자라니 수생목 상생 관계로 본다. 이렇게 오행 중 서로 살려주고 도와주는 기운을 상생의 작용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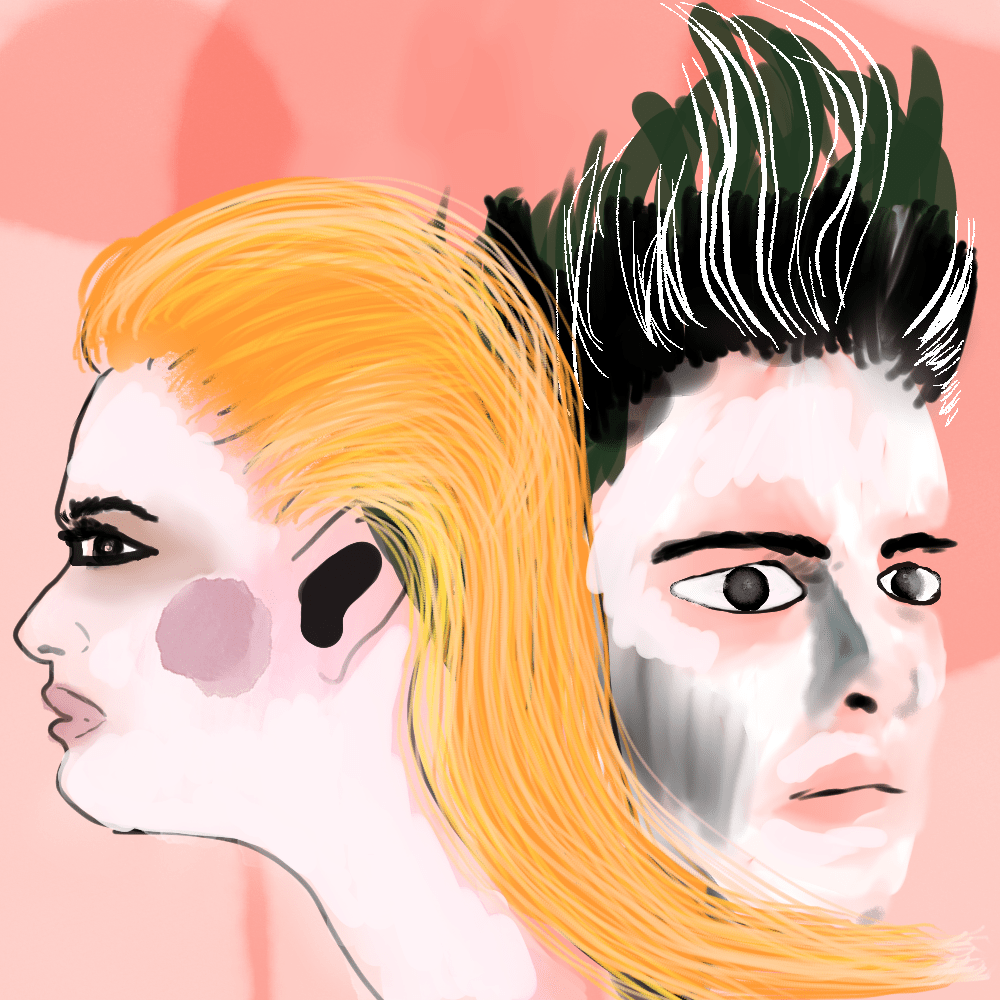
2.음양오행의 상극(相克)
목극토-토극수-수극화-화극금-금극목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중 나무의 뿌리는 흙을 파고 들어가니 목극토이며 흙은 댐으로 물을 가두어 모으기도 하지만 비 등이 들이닥칠 때 흙이 파헤쳐지거나 흩어지니 토극수하며 물은 불을 끄니 수극화 상극 작용을 한다.
또한 불은 쇠를 녹이니 화극금이고 쇠는 나무를 베거나 자르니 금극목 상극 관계에 놓인다.
3.역생(逆生)
화생목-토생화-금생토-수생금-목생수
역생은 상생 및 상극과는 다른 개념으로 나무는 불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화생목이라 한다.
수극화로 물로 불을 끄려고 하면 토극수로 흙이 물을 억제하기에 토생화가 되는 것이다.
금은 토의 상극인 나무를 금극목으로 막아주니 금생토가 되며 수는 수극화로 금을 녹이는 불을 끄니 결국 수생금하게 되며 목은 물길을 가로막는 토를 목극토로 파헤쳐주어 물이 마음대로 흐르게 하니 목생수를 하게 된다.
역생은 상생이나 상극보다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상생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보은의 의미로 역생을 이해하면 된다.
4.역극(逆克)
토극목-수극토-화극수-금극화-목극금
역극(逆克)은 사주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오행(五行)의 상극(相克) 관계가 거꾸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극(克)’은 한 오행이 다른 오행을 제압하는 관계를 뜻하지만, 역극은 오행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제압당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제압하려는 대상을 압도하는 현상이다.
4.1.토극목
땅이 너무 딱딱해서 굳으면 나무가 땅을 파지 못하고 부러지니 토극목이며 수생목하는 수를 토극수로 막으니 토극목하게 된다.
이를 토다목절이라하는데 남자의 경우 처복이 없다고 한다.
4.2.수극토
비가 너무 많이와서 물이 불어나면 흙이 물을 막지 못하고 물에 쓸려 내려가니 수극토하게 되어 수다토류 즉 물이 너무 많아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4.3.화극수
화로 속의 불은 쇠를 녹이지 못하고 뚜껑을 덮으면 꺼져버리니 도리어 금극화를 하게 된다.
이를 금다화식이라고 하는데 약한 불의 기운으로 금을 제련하다보니 타오르지 못하고 제풀에 꺼지는 형국이다. 이런 사주는 보통 이별이나 소송, 바람, 탐재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기 쉽다고 한다. 일은 잘 벌리나 마무리 못하고 오히려 화만 초래하는 경우의 사주에 많이 발생한다.
4.4.금극화
도끼도 적당히 강해야 나무를 벨 수 있는데 칼이 너무 작으면 나무를 베거나 자르지 못하고 오히려 부러지기 일쑤다. 이를 목다금결이라고 한다. 먹을 것이 많아도 다 취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보면 된다.
역극이 의미하는 것은 수위 조절 못하고 오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몸에 치명상을 입거나, 예기치 않은 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역극 당했다고 본다.
5.통관(通關)
음양오행학은 기본적으로 중화를 중시하는 만큼 넘치거나 부족한 것을 경계한다.
그래서 막힘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는데 수와 화가 상극 관계로 서로 극하려 할 때 이 사이에 목이 있다면 서로 좋게 중재 역할을 하니 통관했다고 한다.
통관의 원리:
- 수와 화가 상극할 때는 목이 통관
- 화와 금이 상극할 때는 토가 통관
- 금과 목이 상극할 때는 수가 통관
- 목과 토가 상극할 때는 화가 통관
- 토와 수가 상극할 때는 금으로 통관
6.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공부하는 이유 및 정리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역생 및 역극 통관 등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주 명식의 뼈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은 우선 기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진 여러 글자의 조합인데,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오행의 생극관계 속에서만 드러난다.
어떤 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한지, 어느 기운이 쇠퇴하여 보조가 필요한지, 혹은 서로 극하여 충돌하는지 등을 읽어낼 수 있어야 전체 명식의 균형을 가늠할 수 있다.
오행의 관계는 곧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향과 사건의 상징으로 전환된다.
길흉화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 상생의 기운이 잘 돌면 사회적 협력과 성장의 기운으로 나타나고, 상극이 과도하면 갈등과 제약으로 드러난다.
역극이 작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실패가 발생하기 쉽고, 통관이 잘 이루어지면 위기를 넘어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가 길흉화복 해석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사주는 단순히 운명을 단정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되찾고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학문이다. 상극이 과하면 통관을 찾아야 하고, 상생이 지나치면 제어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이해해야 비로소 대운·세운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보완과 선택이 필요한지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처방과 조율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라도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알아야 한다.
명리학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동양 사유의 연장선에 있다. 오행의 상호작용을 공부하는 것은 곧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이루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 중화(中和)와 조화(調和)의 철학은 단순히 개인 운명 해석을 넘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유 체계로 확장된다. 즉, 철학적 우주론적 기반을 익히기 위한 명식 해석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다.